도라온 도라이, 천상의 아미

“뭐라고요?”
“쓰다듬으면 계약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도 하실 건가요?”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단지 지금 내 눈앞에서 누워 있는 남자는 천사, 요정, 미의 남신?
뭐, 그런 단어로도 그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존재하다니!
얇은 쌍꺼풀에 깊이 있는 갈색 눈동자, 마치 우주를 담은 것 같은 그의 눈은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했다. 찬란 그 자체였다. 이전에 그가 감고 있던 눈은 그의 미모를 감추는 핸디캡이었다.
하늘에 대한 원망이 절로 나왔다.
불공평합니다. 신이시여!

어째서 저에게는 오징어 같은 외모를 주시고, 저 남자에겐 천상의 미모를 주신 겁니까?
자괴감에 빠져 있던 나를 깨운 것은 그의 달콤한 목소리였다.
심한 자괴에 빠져 있는 내게 그 남자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셨죠?”
미친다. 목소리까지 이러면 반칙이지 않나.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저 눈만 깜빡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남자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니요. 잘 들려요.”
“지금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셨죠?”
“네…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네?”
뭐라고? 성희롱으로 쇠고랑을 차는 줄 알았는데, 잘한 거라니? 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위험해! 잘 생긴 사람은 다 위험하다고! 벌써 잊은 거야? 그때 그놈에게 재산 다 털리고 인생도 망가졌던 거?’ 내 안의 자아가 속삭였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어쩌면 운명인지도 몰라.’
‘이 바보야! 잘생긴 남자가 너를 왜 좋아하겠어? 분명 사기 치려는 거야. 저 남자 쓰다듬으면 큰일 난다고! 감옥에서 평생 보내야 될 지도 몰라!’
‘꺼져. 날 방해하지 마. 저 미소는 거짓 없는 미소야.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던 순간, 남자가 다시 말했다.
“강요는 안 해요. 당신의 의지에 맡길게요. 원하면 쓰다듬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 쓰다듬어주길 원해요.”
꽃뱀한테 홀려 전재산을 잃은 사람에게 이런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땐 자기 합리화나 핑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라 생각했다.
한데, 오늘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서큐버스,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팜므파탈, 뭐, 이런 류의 강력한 파워를 지금 나는 실감하고 있었다.
게다가 달콤한 목소리에 매너까지 좋았으니, 정모 씨 저리가라의 알파남이다. 역시 ‘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이 정도면 ‘매너가 신을 만든다’고 할 정도였다. 무언가에 홀린 듯 정신이 몽롱해지자 그가 다시 말을 걸었다.
“하지만 즉시 계약이 성사됩니다.”
“네? 계… 계약이요? 무슨 계약?”
아름다운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저와 당신이 종속되는 계약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거 완전 운명인가? 내 로맨스 소설 같은 이 상황이 이렇게 쉽게 오다니, 설마 이 남자… 무언가 수상한데.
나는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봤다. 이 상황이 수상하긴 하지만, 과거 사기꾼과는 다르다. 그때는 내가 가진 게 많았고, 지금은 거지다.
즉,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이 남자가 원하는 것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럼 설마 진짜 사랑?
이렇게 망상을 하다 곧바로 섬뜩한 의문이 밀려왔다.
‘잠깐,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내 방에 들어온 거지?’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보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하늘에서 왔습니다. 시간의 공백이 끝나, 하늘에서 저를 내려 보냈어요.”
뭐? 시간의 공백?
이건 3년 전 그 사기꾼 스님이 말했던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정말 하늘에서 보낸 거라고? 전혀 납득이 되질 않아!!
“싸이코나 하는 소리를 하시네요. 하늘에서 왜 저한테 이런 잘생긴 아저씨를 보내주죠?”
“궁금하시면 쓰다듬어 보세요. 해치지 않아요.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남자는 말을 마치고 치명적인 미소를 지어보였다.
갈등이 일었다. 수상한 사람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겼는지, 또 말에 기품까지 있고 젠틀하며 단정했다.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리가…
과거의 상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쉽지 않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보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다. 또 손해볼 것도 없고요. 보아하니 가난하신데, 저와 계약을 하면 이 상황에서도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난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친절하고 호의적인 사람은 백 퍼센트 사기꾼이다. 재빠르게 협탁데 놓인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리자 순간, 그가 협탁 위의 내 스마트 폰을 집어 들었다.
아, 한발 늦었다.
비통함에 모서리칠 때 그는 그저 내게 스마트폰을 건넸다.
“신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단지 당신을 도우러 온 존재일 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어요.”
여전히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그 남자.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의심은 거둘 수 없다.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이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눈동자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딱 걸렸다. 이 쉐퀴. 수상하더니, 역시 뭔가 있구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시선을 돌려 어디론가 쳐다봤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속지 않으려 했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어쩔 수 없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나도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곳엔 그가 덮은 이불이… 차마 말 못하겠다.
“이런 씨… 변태 새퀴가!!!”
나는 그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다. 왜 그는 머리채를 풀려 하지 않고, 이불을 더욱 끌어안으려는 걸까? 마치 절대 몸을 보여줄 수 없다는 듯 절박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변태 행위를 하는 이런 녀석을 용서할 수는 없다. 잘생기면 다냐? 얼굴만 믿고 이런 짓을 하다니! 하늘에서 보낸 사람은 개뿔, 그 거짓말에 속을 줄 알았나? 내가 오늘 너를 요절을 낼 테다!
“으아아아아아! 고정하세요, 공주님!”
뭐래? 공주님? 미쳤나, 이 남자가. 정신 나간 소리로 도망치려는 건가?
기본적인 내 자아는 상실한 체 분노 극강, 게다가 주먹으로 소도 때려잡을 저 깊숙이 숨겨 놓은 전투모드 자아가 드러나왔다.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키는 작아도 근골질에 나무도 발차기 부러뜨린 말벅지의 소유자.
그놈의 머리채를 잡고 하이킥을 차려는 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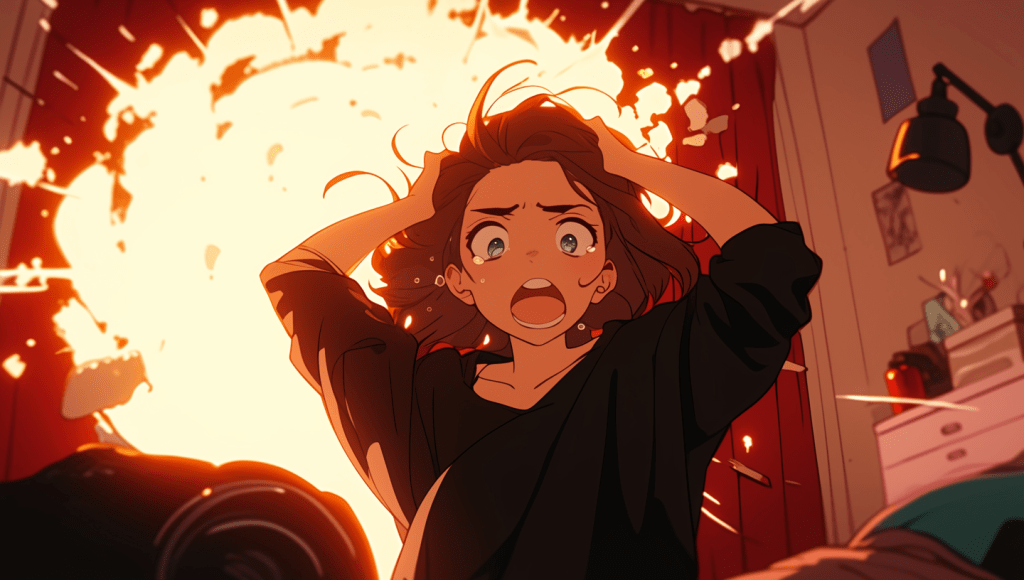
그 남자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눈이 부셔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눈을 가렸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환희에 찬 듯 들렸다. 빛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웬 어린아이?
대체 8등신 남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4등신 아이가 있는 것인가?
“너 뭐야?”
“저는 오랑이라고 합니다.”
“이름 말고, 네 정체가 뭐냐고?”
“천상에서 온 신입니다.”
“진짜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보면 모르세요? 어른에서 아이로 변신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너프 될 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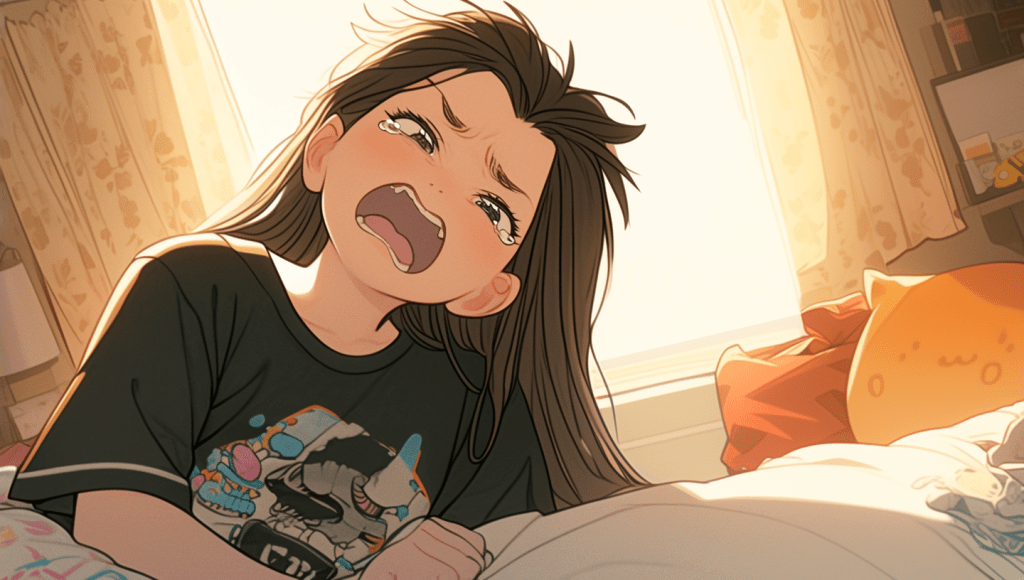
이렇게 말하곤 그는 엎어져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몸은 아이로 변했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걸걸할까? 작은 몸으로 침대를 때리며 우는 모습이 어딘가 기괴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다.
머리채를 잡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전에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 전화기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내 손을 자르기라도 해야 할까?
2021년 8월 29일, 이 날 나는 오랑의 미모와 미소에 홀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털렸다.
이건 모두 몰상식하고 비현실적이며 무모하고 망신스러운, 사랑의 호르몬이 불러온 참사였다.
사랑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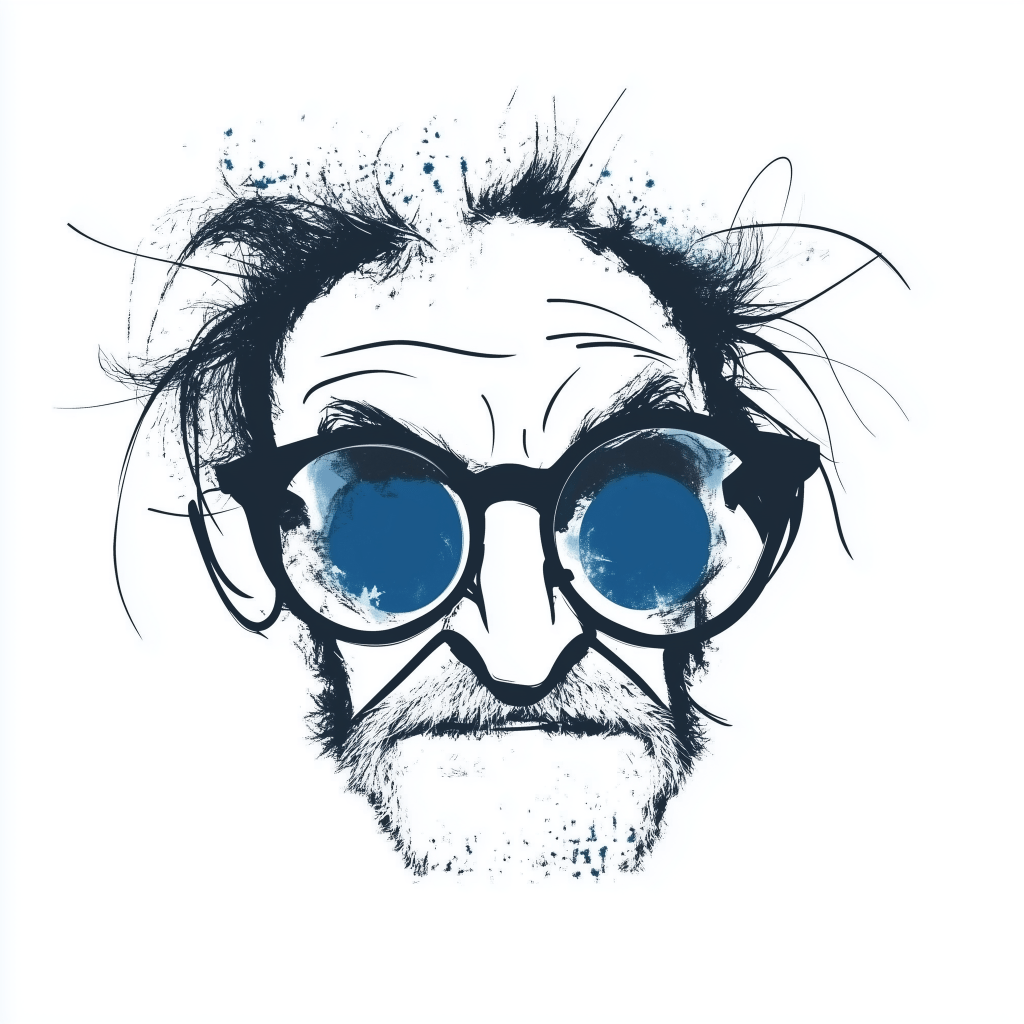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