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온도라이, 천상의 아미


크렁! 갑자기 들린 천둥 같은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 우렁찬 소리는 다름 아닌 내 코 고는 소리였다.
잠에서 이렇게 깰 수도 있구나 싶어 감탄했다. 또, 밥을 먹고 명상에 잠기려다 나도 모르게 잠들었음을 깨달았다.
전등 불빛이 거슬려 눈을 감고 무념무상을 되뇌었을 뿐인데,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니… 빌어먹을 포만감이 내 신성한 명상을 방해했다.
역시 포만감과 졸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밥을 배터지게 먹고 소화도 시키지 않은 채 잠들었으니 내 몸은 불어날 것이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잠들었던 나 자신이 싫어졌다.
이 모든 게 내 브레인 때문이다. 포만감에 잠을 자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낸 빌어먹을 뇌 때문이었다.
그래, 뇌가 내 몸의 주인인 거다! 내 생각의 주체는 자아라고 믿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멜라토닌이 아니라 차라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아드레날린이나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뇌가 이런 요청을 들어주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
내 자아가 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자아를 통제하는 것 같다. 빌어먹을 뇌의 메커니즘…
어차피 빌려 쓸 거라면 좀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쭉쭉빵빵한 8등신 몸매로. 내가 원했던 건 화려한 외모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몸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유전자는 무섭다. 두 부모 중 가장 좋은 것만 물려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최악의 유전 형질만 물려받았을까.
마치 태생부터 저주받은 운명처럼 느껴진다.
내겐 오빠가 한 명 있다. 그는 정말 아름답게 생겼다. 그의 얼굴을 보면 예술 작품 같은 고결함이 느껴진다. 어릴 적엔 사람들이 모두 오빠를 딸로 착각했다.
반면 나는 딱 봐도 못생긴 남자아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9살 때까지 내가 남자인 줄 알았다.
그러다 학교 가는 길에 동급생이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는 걸 보고 내가 없는 무언가를 달고 있는 걸 발견했다.
“야, 너 그거 뭐야?”
“꽈리고추.”
“뭐? 왜 나는 그게 없지?”
순간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에게 왜 나에게 그걸 달아주지 않았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때의 나는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느꼈던 것 같다.
결국 빗자루로 얻어맞고 나서야 더 이상 동생이 달고 있는 거 떼서 달아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여자로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외모로 태어날 거면 차라리 남자처럼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는 못생겨도 돈 많고 능력 있으면 로맨스를 할 수 있다. 더하면 세상 여자들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경험상 못생긴 여자에게 로맨스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돈 많고 능력 있어도 조리돌림을 당하지 절대 사랑받지는 않는다.
나의 이 모순된 감정은 결국 성질로 이어졌다. 성질이 나서 그대로 두 다리를 들어 올려 하이킥을 했다.
그런데 침대의 반동이 평상시와 달랐다. 평소 같았으면 단단한 침대의 반동이 왔어야 했는데 이번엔 무언가 부드러운 것을 찼다는 느낌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옴마야! 세상에 이럴 수가! 내 침대에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이 원룸으로 이사 온 후 단 한 사람도 들인 적이 없었던 터라 나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
여자? 일단 여자로 보였다. 내가 수선을 떠는 와중에도 꼼짝 없이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그녀.
‘너는 누구냐, 대체?’ 머릿속으로 그녀가 내 집에 들어온 경로를 추리하기 시작했다.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이거나 술에 취해 들어온 걸까? 아니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냈던 걸까?
그러다 유난히 길고 찰랑거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떡 벌어진 어깨가 눈에 들어왔다.
‘우와, 이 여자 소싯적에 수영 좀 했나 보다.’ 넓은 어깨는 평범한 여성의 체형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다.
깨워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어깨를 흔들려던 순간 또 한 번 놀랐다. 상반신이 탈의 상태였다.
남의 집에 들어와 옷까지 벗고 침대에 누워 있다니… 꼴에 가슴까지 이불을 꽉 끌어안고 있는 모습에 어이없어졌다.
나는 미스터리한 여자를 깨우기 위해 손을 들었지만 왜인지 손이 덜덜 떨렸다. 다른 손으로 손목을 잡아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뻗으려던 순간, 섬뜩한 느낌이 밀려왔다. 새카만 머리카락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머리칼은 너무나도 반짝였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마치 별빛을 받아 빛나는 것 같았다. 혹시 그녀가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다.
우웨에에에! 설마, 귀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팔뚝의 솜털이 자석에 이끌리는 철가루처럼 일어서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난생처음 겪어보는 소름 끼치는 상황에 겁 없는 나도 무서워졌다.
그녀의 흑발과 핏기 없는 어깨, 유령 같은 피부색에 나는 차마 계속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방바닥에 성경책이나 염주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다. 한 달 전 엄마가 주신 염주를 거부했던 걸 후회했다. 그때 엄마가 말했었다.
“이 염주 차고 다녀. 귀신 쫓아준다더라.”
“뭐, 엄마 돌았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푸하하하하.”
나는 그 말이 그저 미신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염주가 간절하게 필요했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염불이라도 외워야 하나.
어릴 적 엄마 따라 절에서 서당개처럼 주워 들었던 염불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읊조리기 시작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눈을 감고 염불을 웅얼거리며 그녀가 사라지길 바라며 눈을 떴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곧 안심할 수 있었다. 그녀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이라면 숨을 쉬지 않을 것이다.
진작에 확인할 걸. 괜히 오해했다. 귀신이 아니란 걸 확인하자 마음이 놓였다. 그녀의 발도 사람처럼 뽀얗고 예뻤다.
발끝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듯한 그 모습에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평범한 사람의 발이 이렇게까지 예쁠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어휴, 이런 망상쟁이.’ 내가 이런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내 원룸에 이 여자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생각에 다시 소름이 돋긴 했지만, 이 여자는 사람이다.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온 나는 고양이 발걸음처럼 조용히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입은 저절로 벌어졌다. 극강의 비주얼이었다.
‘진짜 예쁘다…’ 같은 여자를 보면서도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스스로도 한심했다.
결국 그녀의 코앞까지 다다르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아름다웠다. 찬란할 정도였다.
갸름한 얼굴, 깐 달걀 같은 피부, 풍성한 속눈썹, 오똑한 코, 야무진 입술… 보고만 있어도 환상적이었다. 마치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이거 성형이야. 코에 심지 박고 속눈썹 연장술에, 피부과는 일주일에 다섯 번은 다니겠지. 애니에서 튀어나온 것 같잖아? 성형이 아니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 안의 또 다른 자아가 속삭였다. ‘섣불리 오해하지 마. 자연 미인일 수도 있잖아?’
아,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슬프다. 왜 신은 몰아주는 걸 좋아할까.
돈도, 명예도, 외모도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는 것 같다. 엄친아, 엄친딸 같은 존재들이 바로 그 몰아주기의 결과물일 것이다.
신은 정말 불공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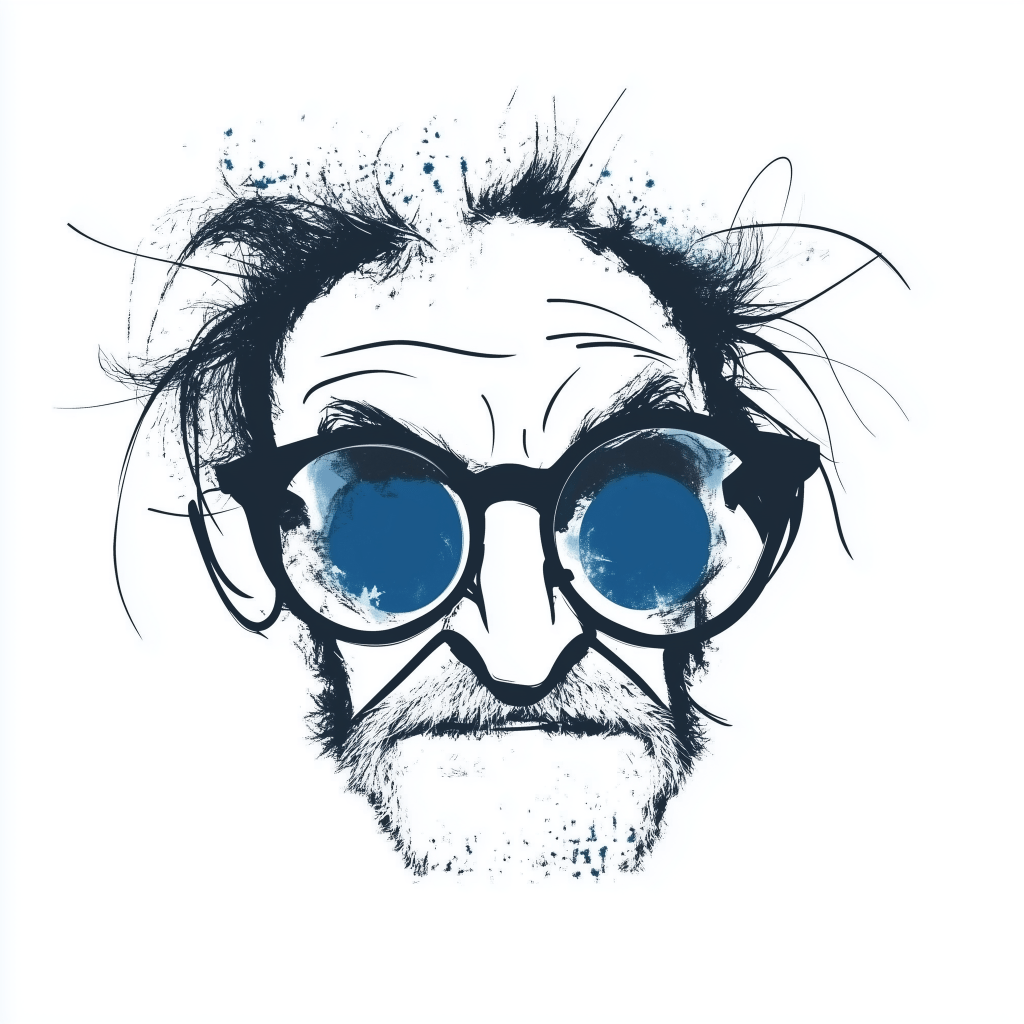
Leave a reply to HELLO, BATAL'S WORLD Cancel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