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온도라이-천상의 아미

“그러길래 미친년아. 멀쩡한 직장은 왜 때려치우고 시나리오 작가 하겠다고 설쳐대서 이 지랄이냐고. 이년아.”
“고만해, 엄마. 내가 더 비참하다고.”
“집 전세 보증금에 적금통장까지 다 털어줄 정도로 그놈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크니까.”
“뭐라고?”
“코가 커서 좋았다고.”
엄마는 내 말에 순간 멍해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 작게 ‘미친년’이라 읊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게 더 싫었다. 차라리 보이는 걸 닥치는 대로 잡고서는 날 후드려 패기라도 하지. 엄마의 한숨과 깊은 눈빛이 나를 더욱 짓눌렀다.
그녀는 한참 동안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웠던 엄마. 지금은 점점 늙어가는 그녀. 가슴 한편이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애써 무시했다. 이 감정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벅찼다.
분명 엄마는 한탄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저런 년을 왜 낳았을까’라면서. 빠듯한 살림에 힘들게 일해서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이게 뭐냐고.
나는 모든 걸 포기한 자포자기 상태였다. 실연과 사기를 당하고 곧바로 일어설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과 벗어나지 못하는 그늘.
내가 왜 내 처지를 모르겠나. 바보 같은 결정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엄마는 알까? 내가 망가진 걸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너무나도 아프다.
솔직히 3년이면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뭔가 해낼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고, 남은 것도 없었다. 나를 돌아볼 때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늘 한숨이었다.
휴~
방바닥이 꺼질 듯 깊은 내 한숨 소리에, 엄마도 따라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작은 빨간색의 두툼한 봉투였다.
“이… 이거, 부적이잖아? 왜?”
“지니고 다녀. 그러면 9월부터 풀린다더라. 으이그, 내가 별 짓을 다한다.”
“뭐 하러 이런 데 돈을 써?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왜 쓸데없이 미신 같은 거 믿는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엄마가 준 부적을 보자마자 화부터 났다.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신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 결국 난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필요 없어. 이딴 거.”
나는 부적을 방바닥에 툭 던지고는 그대로 집을 나왔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
시나리오밖에 할 줄 모르는 내가, 그걸 세상에 내놓겠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2년째. 여전히 나는 망생이었다. 완결 하나 냈지만 조회수는 1000도 넘지 못했다.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장르 또한 비주류. 그렇다 해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내 실력이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뭐라고 그렇게 집착하면서까지 썼을까? 맨땅에 헤딩하듯이, 모두가 외면하는 이야기를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붙잡고 있었을까. 이제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놓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이야기라 더욱 놓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 사랑꾼을 가장한 똥파리 같은 사기꾼이 꼬인 이야기, 설정을 도둑질당한 이야기. 어쩌면 내 잘못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집착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정말로 놔야 하는 걸까? 5년을 끌어온 이야기인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건 버리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에휴. 정말 @같다.
밥을 하기 싫어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다 며칠 전 부적 사건을 떠올리고는 곧바로 단념했다. 왜 나를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 내놨는지.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게 했으니 책임지라고 말한다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계란 한 판 나이에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모두 내 잘못이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 나올 거면 금수저 집에서 태어났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내 잘못이다. 그래서 나는 죽일 년이다.
그때 지랄하지 말고 부적을 챙겨 올 걸. 잘못한 것도 없는 엄마에게 괜히 화풀이만 했다. 그러고는 지금 와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기가 정말 뭐했다.
뚜르르릉! 또르르릉!
이건? 이 신비한 회귀 매직 같은 소리는 전화벨 소리다. ‘내게 회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 위해 일부러 설정해 놓은 소리였다. 또, 엄마의 번호를 특별한 사운드로 저장한 벨 소리이기도 하다.
아무튼 엄마 생각이 나서였을까? 그때 서로 삐쳐서 한 달이나 연락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왜 전화를 하셨을까?
나는 전화를 받았다.
“왜?”
“밥 먹었니?”
“어, 먹었어.”
“안 먹었으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했지.”
“방금 먹어서 배불러.”
뚝. 통화 종료.
엄마가 스스로 자존심을 꺾고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내가 밥을 먹었다는 말에 그 화해는 불발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쉬운 자식이 아니었다. 우리 엄마에게는 참으로 힘든 자식이었다. 그러니 난 후레자식임이 분명하다.
엄마에게 다시 한번 내가 쉽지 않다는 걸 각인시키고는 마트를 가기 위해 대충 사람처럼 차려입었다. 분명 엄마는 두당 2만 원이나 하는 복불고기를 먹자고 했을 것이다.
그 생각에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하얀 쌀밥에 젓갈이 장땡이야! 복 불고기 같은 건 꺼져!”
씩씩하게 혼자 소리 내어 외치고는 집에서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 걸리는 대형 마트로 직행했다.
걸어서 후끈 달아오른 몸이 마트 문을 열자마자 강력한 냉기에 식기 시작했고, 입구 옆에 쌓여 있는 장바구니를 우아하게 팔에 걸치고 쇼핑을 시작했다.
첫 번째 코스로 진입한 곳은 떡볶이 코너. 떡볶이에 시선이 꽂힌 나는 사정없이 눈이 돌아갔다. 내 최애 분식 떡볶이의 다양한 종류만큼 내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왜 이리 세상에는 선택해야 할 것이 많은지 슬프기까지 했다.
돈이 많았다면 모두 장바구니에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처지에는 딱 하나의 선택. 그 선택에 맛과 경제성, 그리고 영혼까지 걸어야 한다.
결국 나는 즉석 떡볶이 대신 쌀국수를 집어 들었다. 동남아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났으면 했지만,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 개량된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아쉽지만 꿩 대신 닭이라는 심정으로 바구니에 넣었다.
왜 마트에 오면 사려고 한 것은 사지 않고 엉뚱한 것을 먼저 사게 되는 걸까? 젓갈을 사러 왔는데 왜 쌀국수를 사고 있는지. 마트의 마법에 또 한 번 감탄했다.
하지만 당하고는 못 산다. 그러나 쌀국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럼 이번만 당해주자.
젓갈을 사러 가려던 순간, 화장실 전구가 나간 게 생각났다. 생필품 코너로 가기 위해 2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우아하게 발을 디뎠다. 거지라도 가오는 있어야 하니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뜻한 햇살이 비치는 풍경이 아니라 비 내리기 전의 우중충한 풍경이었다.
이 씨, 장마라 그런지 더 우울하게 느껴지네. 아드레날린 200프로 충전된 상태면 좋겠다. 그럼 비 오는 장마 풍경에도 까르르 웃을 수 있겠지?
에스컬레이터는 나를 2층으로 데려다줬다. 필요한 물건인 전구를 사기 위해 걸음을 옮기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그 색. 저 멀리 아름다운 민트색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산뜻함에 마음의 평온이 느껴졌다. 오직 진리인 것 같은 민트색.
민트 초코 라떼! 나에게는 사치품이다. 왜 하필 커피 사은품에 붙어 있는지. 오로지 민초 라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아쉽지만 사은품이라 포기는 물 건너갔다.
그런데 아니 저건?
저 구석탱이에 숨겨져 있던 민초 라떼가 한눈에 들어왔다. 단품으로 구성된 나의 플랙스. 번개처럼 집어 넣자마자 내 눈을 사로잡은 연두색 상자, 녹차 라떼였다.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사라는 신호겠지?
그러나 녹차 라떼는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걸 충동구매라 한다. 이성이 나를 구하고 있었다.
왠지 외계인이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겠지? 갑자기 머릿속의 또 다른 자아가 나를 꾸짖었다.
‘이야, 이 서민! 너란 여자, 도대체 왜 이렇게 소심해진 거냐? 스쿠터를 처음 탈 때도 풀 악셀을 당기던 여자가, 바이킹을 처음 탈 때 가장 끝자리에 앉던 여자가 겨우 초록색에 무너지다니… 실망이야!’
맞아. 내 모토는 죽으면 끝이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 정신이자 나를 지탱해온 철학. 초록색 따위에 무너지지 않겠다!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녹차 라떼를 담았다. 지금 나의 용기는 방금 용을 때려잡은 중세 성기사의 기상과 같았다.
기백이 넘친 나는 내 장바구니를 보았다. 쌀국수, 민초 라떼, 녹차 라떼. 흡족했다.
아이고 참, 전구 사야지.
또 사야 할 것을 사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샀다.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싶은 내 개척 정신이 충동구매를 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선택에 후회는 없다. 나는 직진하는 스타일이니까.
아차, 그러고보니 섬유 유연제도 떨어졌지.
정말 필요한 건 안 사고 엉뚱한 것만 사댄다. 소비 패턴에 반성하며 세제 코너에 들렀지만 그냥 지나쳤다. 일단 무거울 것 같아 들고 가기 싫었다.
결국, 진짜 목적인 전구를 사러 갔지만 그냥 지나쳤다. 굳이 대형마트까지 와서 사야 할까 싶었다. 전구와 섬유 유연제는 집 앞 슈퍼에서 사자. 몇 백 원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슈퍼 사장님과의 의리를 생각하자.
이리하여 전구를 사러 올라간 2층에서는 민초 라떼와 녹차 라떼만 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젓갈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저건 뭐지?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것은 극도로 놀랐을 때 근육이 저절로 풀려서 나온 현상이다.
사… 사… 사람이 죽은 거야? 아니… 아… 아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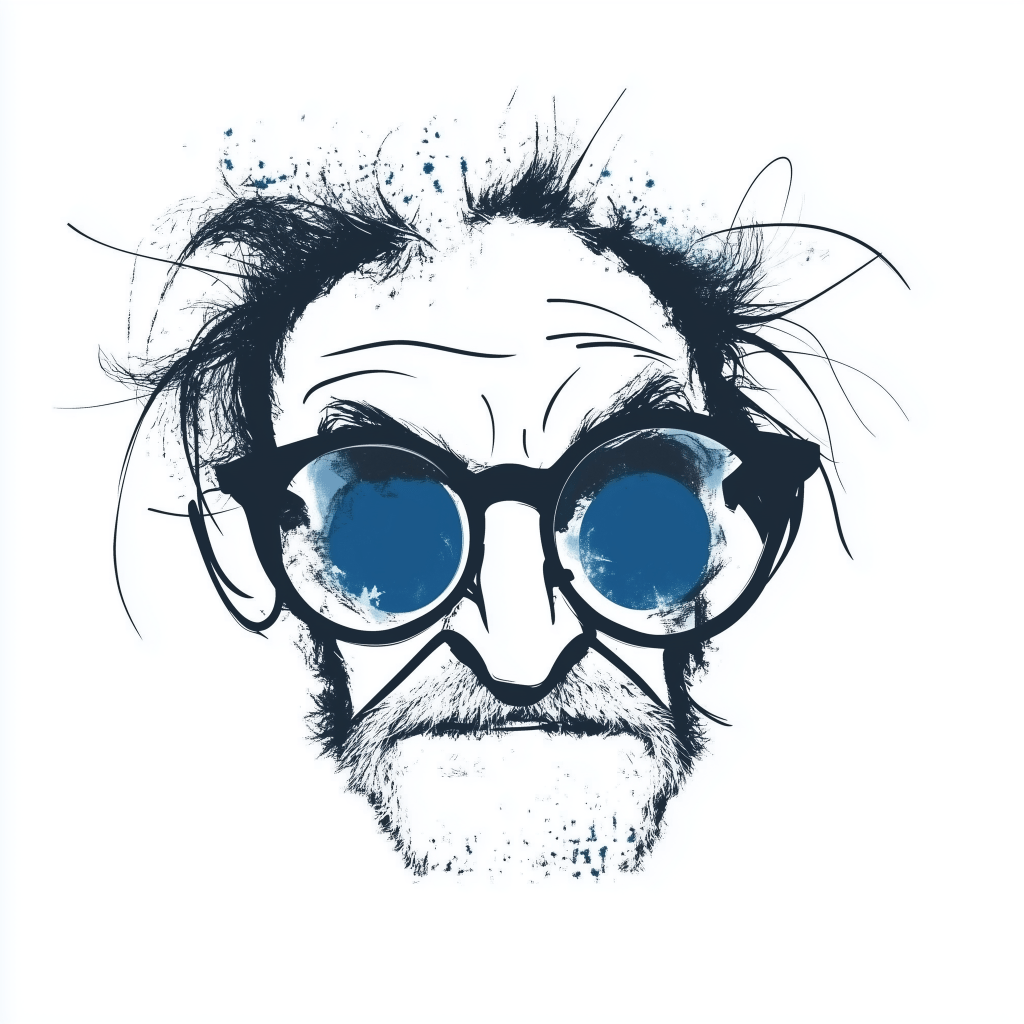
Leave a comment